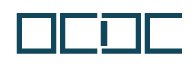왼쪽부터, <승효상-거주의 커뮤니케이션> <장용호-기와조명> <야마모토 리켄-꽃의 방>
동양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려온 대표적인 공간 디자이너들이 3국의 전통생활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족의 대화공간'을 선보인다.
참여작가
KOREA : 승효상 (SEUNG H - Sang)
CHINA : 장용호 (CHANG YungHO)
JAPAN : 야마모토 리켄 (YAMAMOTO Riken)
‘가족의 대화 공간이라는 기획전은 동양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려온 대표적인 공간 디자이너들이 3국의 전통생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는 3국의 생활 문화적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건축가인 H-Sang Seung(Korea), Yung Ho Chang(China), Riken Yamamoto(Japan)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일상생활 속 커뮤니케이션 공간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이번 전시는 전통적으로 소통과 사유의 공간을 중시해 온 삼국의 주거문화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며 이를 통해 현대적 생활양식에 맞는 디자이너들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였다.
한국 건축가 승효상은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당과 방을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하였다.
“한국의 마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당은 주거형식이 다양성만큼 그 성격도 다양하다. 즉 우리의 마당은 변화무쌍한 삶을 담지만 또한 늘 비움으로 남아서 거주자를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삶의 태도와 연관됩니다. 서양 건축에서 각 공간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 반해, 한국의 방은 요를 깔면 침실이 되고 식탁 놓으면 식당이요 서탁을 들이면 서재요 방석 깔면 화톳방이 되었으니, 공간은 항상 거주자의 의지에 따라 그 목적과 용도가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거주방식-거주의 커뮤니케이션은 늘 창조적이며 주관적이었습니다. 문방은 그 대표적 공간입니다.”
중국 건축가 장용호의 ‘Wa Light’는 중국 전통 건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와를 현대적으로 가볍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는 그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와는 예로부터 중국 건축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와는 현대 건축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 요소로, 다른 석조 자재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벼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형하였습니다. 상부의 기와만 그대로 두고 하부의 기와를 제거하였으며, 기와를 강철 케이블에 연결하여 뾰족한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와의 무게를 줄이고 조명이 지붕에서부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 구조물은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역설적 인상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역설적 인상을 주고 있다.
일본 건축가 Riken Yamamoto의 ‘Flower Room’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시장 원리를 우선으로 하는 글로벌리즘에 의해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모두는 이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켄 야마모토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되살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